대표 작품 및 오디오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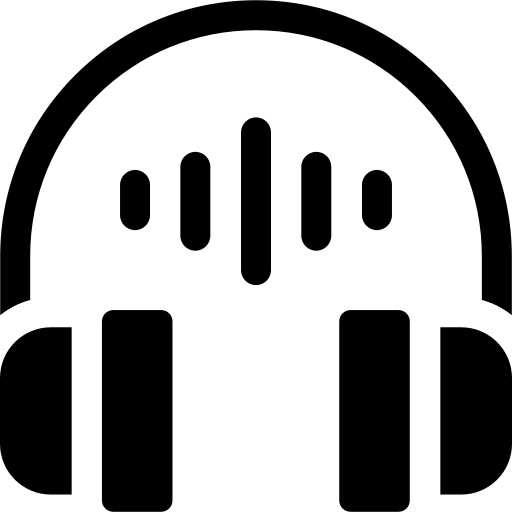

Oil and spray paint on wood panel, 93.3×149.8cm, 2022

Oil and spray paint on wood panel, 61.5×193.7cm, 2023

Acrylic, oil and spray paint on wood panel, 91×91cm, 2022
* 오디오 가이드는 널위한문화예술 & 사적인컬렉션과 함께합니다.
BIOGRAPHY
2011
MA in Fine Art. 첼시예술대학원, 순수미술학과
2010
PG Dip in Fine Art. 센트럴세인트마틴예술대학, 순수미술학과
SOLO SHOW
2023
<Scoop Surface> 상업화랑 을지로, 서울
2017
<쇼룸: 매일의 조각> 디스위켄드룸, 서울
<과, 의 것> 대안공간 아트포럼리, 부천
2015
<인공섬> 동탄아트스페이스, 화성
GROUP SHOW
2024
<Personal Gestures> 피비갤러리, 서울
ARTIST STATEMENT
도려나간 스쿱의 아이스크림도 결국은 하나의 아이스크림이다. 완벽한 원을 만들기 위해 도려지 는 아이스크림은 질감과 재료에 의해서 각기 다른 형태로 잘려 상대에게 전달된다. 도려진 스쿱 의 아이스크림의 단면도 그 덩어리도 그리고 남은 덩어리조차 감정의 원형에서 조각나는 모습들 이다.
우리는 감정의 한 단면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 관계는 결국 감정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림으 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관계 안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감정을 정갈한 형태의 직사각형 혹은 정방 형으로 다듬어서 보여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나는 그 사이에 어그러진 형태들을 느낀다. 그리고 그 어그러짐을 콕 집어 얘기하고는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예민한 사람이 되어간다. 하지만 우 리가 느끼는 감정은 언제나 가지런히 정리된 형태로 나오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 나오는 성격이 나 감정도 수만 가지가 될 것이다. 또한 그 무수한 감정의 겹 역시 그림을 보듯 한 화면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나는 조형을 만들었고, 그 온전한 덩어리를 오롯한 하나의 것으로 바라보았다.
…
READ MORE
무수한 면을 가지고 있는 조형작업에서 최근 선보이고 있는 화면을 쪼갠 부조 형태의 작업으로 의 변화는 나의 버릇과 맞물려 ‘회화와 덩어리’를 어떻게 감정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 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회화는 앞과 뒤라는 면이 명확히 주어지지만 나에게 보이지 않는 뒷면 은 어그러진 형태의 감정이 가진 또 다른 면모와 같이 느껴졌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화면을 자 르고 긁어내고 뒷면을 앞면으로 가져다 놓는 식의 방식으로 작업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잘리고 붙이고 또 탈락하여 버려진 조각도 있다. 이들 역시 감정의 찌꺼기임과 동시에 면의 한 측면이라 판단되어 작업의 소재로써 사용되게 되었다. 찢긴 면과 조각나는 화면의 조각들은 서로 뭉쳐져 감정의 한 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물감은 보다 즉흥적인 감정의 형상이다. 흐르고 덩어리지면서 면에 층위를 더욱 고조시키고는 한 다. 발랐다 지우기도 하면서 남겨지는 흔적들은 그 존재가 완벽히 사라지지 않는다. 손 위로 흘 러내린 아이스크림을 닦아내도 남겨져있는 끈적임 처럼 이 또한 감정의 상처가 남긴 흔적 같은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의 도려내고, 덧발라 다듬어진 감정의 모습은 어떤 형태로 주고받는 것일 까 생각해본다.
ENG
The scooped ice cream, even when carved, ultimately becomes one single ice cream. Carved ice cream, in the pursuit of creating a perfect circle, takes on different shapes due to texture and ingredients. These carved scoops, their cross-sections, and the remaining pieces all depict fragments of the emotional circle.
Are we perhaps only focusing on one facet of emotions? Relationships essentially involve the exchange of emotions. In social relationships, people often prefer to present their emotions in neat forms, resembling rectangles or squares in visual representation. However, I sense distorted forms in between. Every time I point out these distortions, I am labeled as a sensitive person. However, the emotions we feel never come out in neatly organized forms. Just as one person can have various facets of personality, emotions from one person can take on countless forms. Furthermore, the multitude of overlapping emotions doesn’t exist on a single screen like a painting. That’s why I created sculptural work, viewing the complete entity as one distinct thing.
In my sculptural work, which has numerous facets, the recent shift to fragmented forms stems from contemplating how to express ‘painting and entity’ as forms of emotion. While a painting has clearly defined front and back, the unseen backside felt like another aspect of emotions with distorted forms. To express this, I began working by cutting the screen, scraping it off, and placing the backside in the front. In the process, pieces were continuously cut, attached, and sometimes discarded. These discarded leftovers, considered as one side of emotion, came to be utilized as materials for the work. The torn surfaces and leftovers of the screen coming together also represent one side of emotions.
Paint is a more spontaneous manifestation of emotion. It flows and solidifies, adding layers to the surface. As it is applied and erased, traces are left behind, and these marks don’t completely disappear. Could the stickiness left behind, even after wiping away the ice cream flowed through one’s fingers, be a trace similar to the scars of emotions? If so, pondering the form in which our carved and refined emotions are exchanged becomes a thought-provoking question.
CRITIQUE
‘이미지-기억들’ : 역설적으로 표상하다
– 김허경(전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 미술비평) –
일상의 단면, 지속된 기억
프랑스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장 그르니에(Jean Grenier)는 에세이 『일상적인 삶』을 통해 일상에서 보이는 대상들을 분석해보면 일상생활로부터 삶의 결 자체로 넘어가는, 나아가 예술 작품까지 다다르게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길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다. 일상의 삶이 켜켜이 쌓여 바탕이나 상태, 무늬의 결을 이루듯이 김한나는 일상의 감정과 감각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체와 물질의 접점을 찾아 보이지 않는 일상의 단면들을 형상화한다. 누구에게나 존재하지만 좀처럼 포착되지 않는 ‘내적 감정’, ‘기억의 공간’, ‘시간의 지속’을 탐구함으로써 자신이 지각했던 과거의 인상과 남아있는 현재의 잔상을 회화적 매체로 입체화하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작가는 나무 패널, 우레탄 폼, 아크릴, 스프레이, 도료, 시멘트, 플라스틱 등 다양한 오브제를 자르고, 긁고, 뒤집고, 뿌리고, 해체하거나 다시 조합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만의 ‘독자적인 형체(形體)’를 완성한다. 김한나의 예술 행위는 일상 속 임의적 사건과 연계하여 우연히 만나는 오브제들을 작품의 영역에 포괄함으로써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즉 물체와 물질, 그리고 정신의 만남을 통해 하나의 유기적 관계를 생성해 나간다.
…
READ MORE
그렇다면, 작가에게 물체와 물질의 결합, 이들의 유기적 관계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한나에게 조형의 대상인 物(물건), 體(몸), 質(바탕)은 구체적인 모양을 띠는 형태‧형상이며 작품의 본질을 탐구하는 필수적인 요소다. 김한나는 역학적(力學的) 측면에서 색깔, 모양, 크기, 재료 등에 다양한 외력과 새로운 소성을 가함으로써 자신만의 조형 방식을 탐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물체의 구조와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며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부재를 자르거나 연결하고 접합‧중첩함으로써 내부와 외부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실험하고 있다. 작가에게 작품의 완성이란 내면과 외면의 심상이 만나 움직이지 않은 상태, 즉 외력과 내력의 힘이 바로 0이 되는 순간이다. 이번 전시에 출품한 <멜팅 스윗>, <사랑>, <분수>, <우박치는 날>,
김한나는 2017년 《쇼룸 : 매일의 조각》이라는 타이틀로 ‘자신의 일상’, ‘삶의 경험’, ‘기억의 흐름’, ‘시간의 변화’를 담아 이를 주제로 다양한 소재, 각기 다른 모양의 형태들을 쇼룸 형식으로 전시했다. 여기서 ‘매일(Everyday)’은 단위로서의 시간이자, 이와 결합한 행위의 과정, 시간과의 연대를 나타내는 ‘지속’을 의미한다. ‘지속’은 의식에 의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물질세계이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시간을 함의한다. 따라서 시간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속의 과정이기에 결국, 작가는 현재에 기대어 다양한 방식으로 ‘매일’을 해석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김한나는 외부세계와 연결되는 시간의 흐름을 구조화할 뿐 아니라 물체와 물질에 대한 지각을 통해 추상(抽象)의 색채를 덧입히고 있다. 특히 사물이 지닌 여러 측면 가운데 특정한 일부분을 강조하거나 서로 다른 물질을 결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결과물을 제시한다. 그렇다. 작가는 감정(feeling), 정서(emotion), 기분(mood)이 잠재된 자신의 고유한 경험에서 출발하여 현재와 미래를 가로지르며 물체와의 관계성을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앙리 베르그손(Henri Bergson)의 기억이론을 떠올리게 한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기억을 두고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상들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면, 베르그손의 저서 『물질과 기억(Matière et mémoire, 1896)』에서는 개인이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또는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정신’ 등으로 규정한다. 단, 지각된 과거의 기억들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회상에서 떠올려진 이미지를 현재의 시각에서 재구성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베르그손은 “과거는 (…) 우리가 최초의 유년기부터 느끼고 생각하고 원했던 모든 것이 거기 있으며, 곧 그것에 합류하게 될 현재에 기대어, 그것을 바깥에 남겨두고자 하는 의식의 문을 밀어내고 있다”라고 기술한 바처럼, 앙리 베르그손 · 황수영 역, 창조적 진화, 아카넷, 2005, pp. 225-226. 김한나에게 과거는 지나간 현재가 아니며 이전에 겪은 체험 전체가 지금, 현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한나가 기억을 지속한다는 것은 물체와 물질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행위이자 일상의 삶을 접목하려는 일종의 사유적 방법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평면와 입체의 경계, ‘독자적 형체’
작가가 물체와 물질을 통해 지속하고 있는 기억이란 무엇일까. 김한나는 말한다. “기억들은 복잡하게 섞이는 거 같아요. 정확히 어떤 사건이라는 것보다는 저의 경험 중에서 불편한 감정이나 잔재같이 ‘남겨진 감정’이 담겨있어요. 이 감각과 닿아 있는 형상이나 떠오른 이미지들이 작품의 제목이 됩니다.”라고.
베르그손은 『물질과 기억』에서 “우리 일상적 삶의 모든 사건들이 펼쳐짐에 따라 그것들을 이미지-기억들(image-souvenirs)의 형태로 기록할 것” Henri Bergson, Matiére et mémoire, Quadrig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39, p. 86;앙리 베르그손 ‧ 박종원 역, 『물질과 기억』, 아카넷, 2005, p. 142. 베르그손은 물질을 이미지들의 총체(ensembled’images)로 규정한다. 이는 『물질과 기억』의 전반부 논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미지-기억들’은 과거의 모든 경험이 개별성을 갖는 형태들(souvenir), 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 전체(mémoire)를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다시 기술해보면 일상적인 삶의 흐름에 따라 겪게 되는 모든 경험,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저장되었다가 현재 상황, 자극이나 요구에 즉각적인 형태로 떠올릴 수 있는 기억들을 말한다. 이 기억이야말로 우리의 삶 전체이자 의식 전체를 이루는 기억이다. 김한나에게 ‘기억’, ‘남겨진 감정’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복되거나 되살아나는 생각, 흐르는 시간 속에 잇달아 일어나는 일상의 경험이다. 김한나에게 ‘이미지-기억들’을 적용해 보면 무의식 속에 잠자코 잠재해 있다가 어떤 외부 자극, 힘의 작용으로 물체와 물질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기억의 형상들은 바로 김한나가 제시한 캔버스의 틀이자 동시에 구조화된 오브제이며 이는 두께, 길이, 높이, 폭을 주조한 조각의 형태 또는 평면적인 추상의 색채를 띤다.
작품의 주재료인 오브제는 주체 혹은 자아로부터’ 직접 선택되는 일상의 물체, 사물들이다. 철학적 개념으로는 ‘대상(對象)’, ‘객체(客體)’, ‘객관(客觀)’ 등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김한나에게 오브제는 내적 심상을 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주관적인 수단이기에 주제와 내용에 따라 상대적이며 언제든지 가변적이다. 김한나는 실재 경험과 내면을 표상하는 주체를 떠올려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연계함으로써 기하학적인 형태의 조각, 입체적인 평면이라는 자신만의 양식을 새롭게 명시하고 있다. 일상 속 오브제로 작가만의 고유한 ‘이미지-기억들’을 확정 짓고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가로지른다. 이로써 작가는 외적 및 내적 경험의 소재를 순수하게 주관화함으로써 사물 자체의 특성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김한나가 작품에 명명하는 제목들은 단순히 과거에만 국한되어 사라지지 않고, 현재와 연관하여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또한, 김한나가 구축한 ‘독자적 형체’ 역시 과거의 특정한 개별적 인상을 내포할 뿐 아니라 동시에 ‘이미지 기억들’에 관한 사유의 시간을 함축한다. 따라서 작품 제목들은 ‘이미지-기억들’의 단면들이 구조화되어 붙여진 것으로 언어적 표현방식에 적용하는 메타포이거나 역설적 표상(representation)을 의미한다.
가령, <멜팅 스윗>에서도 다른 감정, 경험, 생각을 암시하는 이른바 ‘이미지-기억’을 함의하고 있다. 김한나는 “달콤한 사탕류의 과자를 우리는 스윗이라고 부르곤 한다. 맑고 투명한 자두 빛 사탕을 한입에 넣어 혓바닥으로 돌돌 굴리며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바사삭 깨지며 날카로워진 사탕의 단면으로 입천장이 베인다. 사람의 감정은,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탕처럼 달콤하다가도 그 매서운 단면을 드러내며 생채기를 낸다”라는 설명에서 알 수 있듯 <멜팅 스윗>은 완성된 작품의 제목이자 ‘이미지-기억들’의 메타포다. 이밖에도 김한나는 <하트벨리>와 <사랑>에 대해 “사랑이라는 감정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사회 공동체 사이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발현한 것이다…사랑이라는 달콤한 단어 아래 자행되는 날카롭고, 매서운 행태를 조소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명명된 작품들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정이 역설적으로 조우한다. 따라서 작가에게 ‘이미지-기억들’은 시간의 흐름이 내포된 개인의 감정, 하나의 표상을 나타내는 사물의 현상(現像)들이다.
물질의 작용과 정신의 상상
베르그손이 말한 바와 같이 “과거는 물질에 의해 작용하고 정신에 의해 상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김한나는 물체와 물질을 결합하여 이미지와 오브제에 투영된 현상들을 특정해낸다. 이때 ‘이미지-기억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주변 상황, 감정, 상태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인상을 지칭한다. 2023년에 제작한 <문제의 조각>, <덧니>, <흩어지는 것들>, <빛바랜 순간> 등은 ‘보았던 것’에서 ‘보여지는 것’으로의 전환을 암시한다. 이는 물체를 재현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틈’ 사이의 관계성을 통해 물체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2024년 제작한 작품들은 어떠할까.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들인 <멜팅 스윗>, <분수>, <사랑>,
결과적으로 김한나는 과거와 현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 물체와 물질의 연속적인 영향 관계를 파악해 나감으로써 ‘이미지-기억들’의 표상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김한나는 물체와 물질, 시간과 공간 사이의 ‘틈’을 조율하는 방식,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통해 끊임없이 상상하고 변화해 나갈 것이다. 궁극의 지점에서 ‘이미지-기억들’은 과연 어떤 모양과 형태를 갖추게 될까. 지속한 기억과 일상의 접점, 과거와 현재가 감응하는 지점에 다다르면 저마다 상상하던 모습으로 조우하게 되리라.
각주
1) 장 그르니에‧김용기 옮김, 『일상적인 삶』, 민음사, 2001, p. 11.
2) 앙리 베르그손 · 황수영 역, 창조적 진화, 아카넷, 2005, pp. 225-226.
3) Henri Bergson, Matiére et mémoire, Quadrig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39, p. 86;앙리 베르그손 ‧ 박종원 역, 『물질과 기억』, 아카넷, 2005, p. 142. 베르그손은 물질을 이미지들의 총체(ensembled’images)로 규정한다. 이는 『물질과 기억』의 전반부 논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