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작품 및 오디오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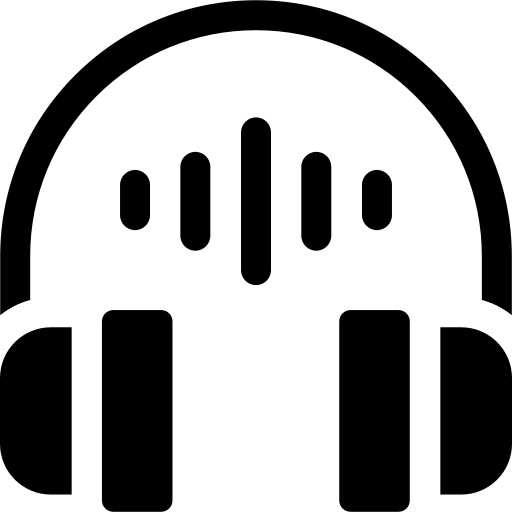

Urethane paint on stainless steel, 147×94×230cm, 2023

Urethane paint on stainless steel, 230×162×320cm, 2022

Urethane paint on stainless steel, 223×151×160cm, 2021
* 오디오 가이드는 널위한문화예술 & 사적인컬렉션과 함께합니다.
BIOGRAPHY
2019
MA.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SOLO SHOW
2018
<이호준展> 갤러리 자운제, 고양
GROUP SHOW
2024
<서울국제조각페스타> 코엑스, 서울
<FLOW> 멘션나인, 서울
2023
<푸른 날개의 노래>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김포
<ZERO GRAVITY> 두남재아트센터, 서울
ARTIST STATEMENT
내 작업의 주요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면 ‘접을 수 없는 종이접기 조각’이라 할 수 있다. 보통의 종이접기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종이를 접음’이라는 형식에 맞춰서 재현한 것이지만, 나는 종이접기 이미지들을 3D 프로그램상에서 모아 오직 심미성을 위주로 조합하며 형상을 만들어 낸다. 이 과정에서 형식은 무시되며, 파괴된다. 그리고 이를 실제 물성을 가진 입체작품으로 재현한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결과물은 실제로 접어서 나올 수 있는 종이접기 작품이 아닌 ‘종이접기의 형상을 한 조각 작품’이 나오게 된다. 종이접기에는 상당한 수학적 함의가 있다. 기하학 원리나 수학 방정식 등 여러 공리나 규칙을 따라야 정확한 결과물들이 도출된다.
…
READ MORE
실제로 종이를 접어서 만들어지는 무언가들은 이런 규칙들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종이접기는 형식적인 부분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나는 형식보다 이미지에 중점을 두는 작업을 하고 싶었다. 시각 예술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이미지라고 생각한다. 형식을 엄중히 지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도 있지만 다양한 시각적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는 것을 힘들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하여 ‘접을 수 없는 종이접기 조각’은 내 작업의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형식보다는 나의 시선으로 재구성된 형상을 종이접기의 형식미를 통하여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종이접기의 기하학적, 수학적 원리를 심미적 관점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작도의 공리를 완벽히 따르기보다는 그 형상의 유연함과 새로운 형태 해석으로 작품의 심미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다.
ENG
The main content of my work can be expressed in one sentence as ‘a piece of origami that cannot be folded.’ Typically, origami reproduces the object to be conveyed as ‘folding paper,’ but I collect images in a 3D program and combine them solely for aesthetics to create shapes. In this process, form is ignored and destroyed. This is reproduced as a three-dimensional work with fundamental physical properties. Rather than folding origami, the result is an ‘origami-shaped sculpture’ that goes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Origami has significant mathematical implications. Accurate results are obtained following various axioms and rules, such as geometric principles and mathematical equations. Things made by folding paper cannot escape the scope of these rules. So, origami was an activity in which the formal aspects were evident. I wanted to work with an emphasis on image rather than form. The most crucial thing in visual art is images that are considered beautiful. Strictly following the format is meaningful in itself, but it is also a factor that makes it challenging to create diverse visual beauty. Therefore, ‘unfoldable origami pieces’ have become an essential keyword in my work. The shape reconstructed from my perspective rather than the form is completed through the formal beauty of origami. This can be seen as utilizing the geometric and mathematical principles of origami from an aesthetic perspective. Rather than perfectly following the axioms of drawing, the aesthetic perfection of a work can be improved through the flexibility of the shape and new forms of interpretation.
CRITIQUE
종이접기를 넘어서: 구성과 구축의 변증법적 심미성
– 안진국 (미술비평) –
평면은 입체의 잠재태다. 작은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고, 이 선들이 다시 모여 면을 형성하듯, 면은 입체로의 변모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것을 가장 직관적이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술이 바로 종이접기다. 종이 한 장으로부터 배, 비행기, 개구리, 학 같은 다양한 입체적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 때문에 종이접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중 하나이며, 학습 활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종이접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입체감과 공간감을 익히게 된다. 간단해 보이는 종이접기 작업이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창의력과 표현의 가능성이 내포해 있는 것이다.
이호준의 작업은 그 형상에서 직접 드러나듯이 종이접기를 그 모태로 하고 있다. 그는 미술교육을 공부하면서, 종이접기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조형적 가능성을 탐색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체임을 깨달았다. 종이접기를 가르치면서 그는 이 매체가 지닌 조형적 잠재력에 매료되었고, 작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종이접기 형태를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그의 접근법은 단순히 종이접기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 깊이와 차별화된 아름다움을 드러나게 했으며,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형태의 종이접기 조각을 형성하게 했다.
…
READ MORE
종이접기의 조각적 변용
한 장의 종이는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창조해 낼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종이접기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인 ‘평면성’과 ‘입체성’의 상호작용으로 이뤄진다. 평면적인 종이가 접히는 행위를 통해 공간을 차지하는 입체적 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속성의 변형을 넘어서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형태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평면성과 입체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 과정은 단순한 종이의 변형을 넘어서, 주변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인식을 변화시킨다. 일상의 사물을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예술적 활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호준 작업의 독특함은 여기에서 발현된다. 그의 작업은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평면성이 큰 특징이며, 동시에 입체성도 놓치지 않는 면모를 보인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가 종이접기라는 형식을 조각으로 차용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면들의 조합이나 면들의 축적을 통해 평면성과 입체성을 연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두 특성을 동시에 지닌 종이접기를 형식으로 차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두 특성을 자신의 작업에 내재하게 한다.
이호준은 종이접기라는 형식을 조각적으로 변용함으로써 친근하면서도 정통적인 조각의 형태를 구현해 낸다. 사실 그의 작업을 ‘종이접기’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작가가 사용하는 재료가 종이가 아니라 스테인리스 스틸, 즉 철판이고, 그가 자신의 작업을 “접을 수 없는 종이접기 조각”이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종이접기로 구현될 수도 없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의 표현처럼 “종이접기의 형상을 한 조각 작품”이 정확한 표현이다. (하지만 그의 작업이 ‘종이접기 조각’으로 통용되고 있어, 여기서도 ‘종이접기 조각’으로 부를 것이다.) 이호준의 작품은 가볍고 유연함과 무겁고 탄탄함, 그리고 평면성과 입체성과 같은 상반된 특성을 동시에 품고 있다. 이는 종이접기의 요소와 조각적 특성이 그의 작업에 공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흔히 종이는 가볍고 유연한 매체로 인식된다. 이를 접어서 형상을 만드는 종이접기는 가벼움과 유연함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호준은 종이접기가 지닌 일시적이고 가벼운 이미지를 넘어서, 무게감 있고 영구적인 조각으로 그 가치 전환을 시도한다. 이는 종이라는 소재의 경량성과 변형 용이성을 넘어선, 무거운 물성을 지닌 재료로 만들어진 조각작품의 느낌을, 종이접기를 통해 재현하려는 것이다. 전통적인 조각의 무게감과 지속성을 새로운 조형적 표현으로 드러내려는 그의 의도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 조각과 같은 정통 조각을 좋아하는 작가는—그의 작업 중에는 종이접기 형식으로 그리스 토르소 조각을 제작한
이호준의 작업의 특징은 작은 종이접기 형상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준다는 것이다.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할 때 몇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데, 특히 작은 것들이 커지면서 원래의 특성이나 느낌이 손실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 중 하나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호준의 작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종이의 경우, 가볍고 얇은 두께 때문에 크기가 커지면서 구조적인 한계로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형태가 변형되거나 휘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종이접기를 크게 하려고 큰 종이를 사용했을 때 원래의 작은 형태와는 다른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호준은 변형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면서도 종이의 평면성을 지닌 스테인리스 스틸 판을 사용하고, 색종이 느낌이 나는 색상으로 작품을 도색함으로써 크기를 키워도 종이접기의 원래 느낌과 유사한 느낌이 들도록 유도한다. 이 때문에 그의 작품은 종이를 사용한 것처럼 가벼움과 유연함을 느낄 수 있으며, 동시에 스테인리스 스틸의 사용으로 전통 조각의 무게감, 탄탄함, 영속성을 지니게 된다. 그의 작업 방식은 작은 것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원본의 질감과 느낌을 잃지 않게 함으로써 독특한 미감을 형성한다.
접을 수 없는/있는 종이접기 조각
이호준의 조각은 제프 쿤스가 풍선아트 캐릭터로부터 영감을 받아 제작한 <풍선 개(Balloon Dog)>와 <풍선 토끼(Balloon Rabbit)>, <풍선 원숭이(Balloon Monkey)> 등과 같은 조각 작품들을 상기시킨다. 두 작가의 작업에는 몇 가지 유사한 점이 있는데, 종이접기와 풍선아트가 어린이가 좋아하는 소재라는 점이나 크기가 작은 형상을 크게 확대하여 제작한 점, 그리고 조각에 맞게 재료를 변경했음에도 원래 지니고 있던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면모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두 작가의 작업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제프 쿤스의 작업은 작은 풍선아트 캐릭터를 그대로 크게 확대함으로써 생경함을 주는 것에 초점을 두는 반면, 이호준의 작업은 종이접기라는 소재를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조각을 탐구한다. “접을 수 없는 종이접기 조각”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호준은 종이접기의 기본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종이접기로는 구현할 수 없는 형태와 구조를 창조함으로써,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작업을 선보인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호준의 작품이 단순한 크기의 확대를 넘어서 종이접기의 예술적 가능성을 재해석하고 확장하는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접을 수 없는 종이접기’는 이호준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종이접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개념은 그리스 조각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작가는 그리스 조각을 좋아한다—, 그리스 조각가들이 여러 사람이 지닌 아름다운 부분들을 조합해 하나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만들어 내듯, 작가는 다양한 부분들을 조합하여 심미성 높은 작품을 완성해 낸다. 먼저 인터넷과 책에서 발견한 다양한 종이접기 작품들을 수집하고 참고하여 매력적인 특정 부분들을 선택한 후, 이를 컴퓨터 3D 프로그램으로 조합하여 예상 이미지를 디자인한다. 그리고 이를 조각으로 구현한다. 이 때문에 이호준의 작업은 종이접기가 지니는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종이접기가 구현할 수 없는 독특한 형태를 지니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작가가 최근 “종이접기 작도의 형식을 철저하게 지킨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작업인 <구축된 종이접기 조각(Constructed Origami Sculpture)> 시리즈는 종이접기의 기본적인 원리와 형식을 엄격히 준수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작가의 기존 생각이 변한 것인가?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이전 작업과 그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존의 ‘접을 수 없는 종이접기’가 황소나 사슴, 개, 양, 변기, 토르소 등과 같은 어떤 측정한 대상을 재현한 것이라면, <구축된 종이접기 조각>은 이와 달리 추상적인 평면 형태의 작업이다. 즉 대상의 확대 및 이상적 형상이 목적이 아니라, 종이접기가 지닌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구조를 미적 형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다. 이호준은 이러한 작업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작업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전의 ‘접을 수 없는 종이접기’를 “기하학과 수학적 공리를 무시한” ‘구성된 종이접기 조각’으로 칭하는 반면, 최근 선보인 평면 형식의 작업을 “기하학과 수학적 공리를 따르는” ‘구축된 종이접기 조각’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구분은 191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에 걸쳐 러시아에서 발전한 예술과 건축 운동인 러시아 구축주의(Constructivism)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작가는 말한다. (더불어 최근 선보인 <구축된 종이접기 조각>이 러시아 구축주의 회화와 그 형태가 유사한 것도 러시아 구축주의의 영향 때문으로 추측된다.) ‘구축(construction)’과 ‘구성(composition)’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대체로 동일한 예술 운동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러시아 구축주의는 러시아 구성주의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이 예술 운동은 ‘구축’이라는 의미의 러시아어 ‘Конструктивизм’을 사용하고 있어, 구축주의가 보다 정확한 표현이지만, 국내에서는 구성주의와 함께 혼용하여 사용되곤 한다.) 구축과 구성은 상호교환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각기 그 초점이 다르다. 엄밀히 따지면, ‘구성’은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반면, ‘구축’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기술적 구조물을 만드는 예술적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호준은 이 두 개념을 작품에서 탐구하고 있다. 그는 매력적인 부분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새로운 형태 해석으로 작품의 심미적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 주목하면서 ‘접을 수 없는 종이접기’, 즉 ‘구성된 종이접기 조각’을 선보인다. 동시에, 기하학적인 요소와 잘 짜인 기계적인 특성, 구조적 완결성을 갖춘 ‘구축된 종이접기 조각’을 제작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이접기의 두 가지 특징, 바로 조형미와 기하학적/수학적 공리를 함께 작품에 담아낸다. 이러한 시도는 종이접기의 전통적인 형식을 넘어서 새로운 형식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예술적 탐구와 창조의 영역을 확장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심미적 원본과 형태 해석
이호준은 재현을 통해 종이접기의 심미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작품이 원본을 뛰어넘는 새로운 ‘원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종이접기의 기하학적이고 수학적 원리를 심미적 표현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단순히 작도의 공리를 따르는 것을 넘어서 유연한 형상과 새로운 형태의 해석을 작품에 담아낸다. 이호준의 종이접기 조각은 종이접기의 본질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으면서도, 외적으로 종이접기의 예술적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그의 작업은 전통적인 조각의 개념에 혁신적인 시각을 제공하며, 대중에게 새로운 미적 경험을 선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