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작품 및 오디오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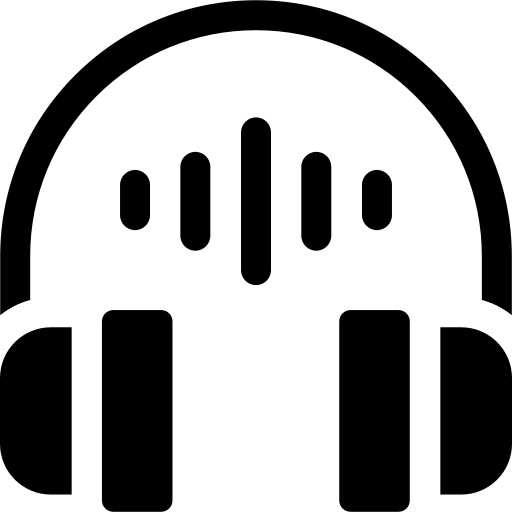

Korean ink on Korean paper, 97×162cm, 2021

Mixed media on Korean paper, 145×112cm, 2021

Korean ink on Korean paper, 130×324cm, 2023
* 오디오 가이드는 널위한문화예술 & 사적인컬렉션과 함께합니다.
BIOGRAPHY
2022
MFA.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2018
BFA. 성신여자대학교, 동양화과
SOLO SHOW
2023
<하늘모음곡(Shamayim Suite)> 갤러리 라메르, 서울
GROUP SHOW
2023
<Permeate the Fall> 써포먼트 갤러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신년인사회 기념전> 예술의 전당, 서울
2022
<아트플로우 Greetings> 이코노그라피아, 서울
<Soul & Spirit> 토포하우스, 서울 외 다수
ARTIST STATEMENT
<Shamayim>
Shamayim(솨마임) : שמים : 하늘
분주히, 아주 분주히 돌아가고 있는 이 땅보다도 더욱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다. 쉴 틈 없이, 정말 단 한숨도 돌릴 틈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보다도 더 쉼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다. 아주 고요하게, 그러나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존재, 바로 ‘하늘(Shamayim)’이다. 맑은 날, 고요하고 평온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 보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 하늘을 발견할 수 있다.
소리 없이 구름을 서서히 떠밀어 주기도 하고, 찬란한 노을의 색으로 물들이기도 하며, 바다를 거울삼아 눈 부신 빛을 선사한다. 그리고 하늘은 우리에게 다음 날을 선물해 주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변함없이 아침을 연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날에도 저 하늘은 우리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 천천히, 그러나 힘 있게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어쩌면 하늘은 이 땅의 세상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 큰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
READ MORE
거대한 이 세상을 움직이며 하루를 열어주는 광활한 하늘의 풍경 앞에 서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하늘을 두 눈에 담고, 구름의 향기(雲香)를 머금어 본다. 그리고 구름 사이로 떨어지는 하늘이 선사하는 빛을 마음 가득히 채운다. 찬란한 하늘의 색을 잠시 감추고, ‘우리만의 하늘색’으로 마음을 물들이며,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하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그래, 절대 우리만 힘든 것 아니야, 라고 위로해 보며.
※ ‘Shamayim(솨마임)’은 히브리어로 ‘하늘’이라는 뜻이다.
<수묵으로 수놓은 하늘 풍경> 이 세상의 모든 색(자연의 색과 인공적인 모든 것에서 볼 수 있는 색)은 하늘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보통의 ‘하늘색’이란 일반적으로 하늘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연 파랑색’을 떠올린다. 그러나 하늘은 시시각각 변하며 무수히 많은 색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무지개의 스펙트럼 안에는 단정 지을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색의 조합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스펙트럼은 ‘노을’에도 존재하며, 계절에 따라, 또 날씨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하늘의 색도 그 스펙트럼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모든 것들도 다 ‘하늘의 색’의 스펙트럼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색을 머금고 있고, 만물의 색이라고 일컬어지는 ‘묵색’이야말로 하늘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수묵의 ‘흑백’이 선사해주는 ‘상상의 여지’의 매력에 빠져본다. 흑백의 하늘을 관람하는 이들마다 각자 다른 개인만의 ‘하늘색’을 떠올려 작품을 보는 이들의 마음에 ‘그들만의 하늘의 색’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한다.
또한 작품에서 빛이 되는 흰 부분은 다른 흰색 안료를 더하지 않고 한지 그대로 두는 것을 고집한다. 한지 고유의 여백이 영롱한 햇빛이 되고, 그 영롱한 빛을 위한 먹빛이 구름과 일렁이는 파도를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작품 속에 어둠을 그려 빛을 더욱 밝힌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이 여기 있다고 속삭이듯이.
ENG
※ ‘Shamayim’ means ‘sky’ in Hebrew.
CRITIQUE
최명원: 젊은 세대가 초월적인 세계를 재현하는 방식
– 고동연 (미술사가) –
‘아…. 또 하늘을 그려서 망했어….’ 초등 고학년, 중학교 시절의 나는 마무리 과정에서 하늘만 채색했다 하면 망치는 지름길을 걸었다…. 그렇게 하늘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던 작은 아이는 이제 하늘만을 주로 그리고 있다. 돌이켜 보니 모든 그림에 하늘의 구름들을, 빛들을 욱여넣어 그리려니 망하는 지름길이었던 것 같다. 풍경의 모든 요소를 배제하고 하늘을 주제로 그리는 작업을 이어오며 확실해졌다. ‘아! 내가 역시 하늘에 욕심이 있었구나.’ 최명원 20241)
이미지는 지시하고자 라는 개념이나 대상과 모순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특정한 상(相)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것이 재현하고자 하는 개념을 드러내는 일이 더 힘들어진다. 사랑, 슬픔, 초월자, 이상향 등의 추상적인 개념이 듣는 이들에게 어떻게 인지되는지 그 합의점을 찾기도 어렵거니와 종교적 이미지, 아름다운 풍경 등의 형상을 사용하는 순간 예술이 단순히 언어적 기능을 대치하는 수단으로 오해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물론 관객에 따라 다양하게 이미지가 해석되면서 특정한 개념을 대신 지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드러나게 된다. 이에 오랫동안 예술인들은 개념과 상(예술작업을 통해서 나타난 이미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왔다.
…
평론 더보기
독일의 미학자이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순수한 미적판단에 대한 그의 서술은 이때 유용하다. 왜냐면 순수한 미적판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술과 리얼리티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예술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예술적 의미를 작업 자체가 아닌 작업을 바라보면서 보편적인 미적 즐거움을 경험하려고 하는 보는 이의 체험에서 단서를 찾고자 했다.2)
‘미’라는 개념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숭고’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다. 미적 욕구에 있어서 즐거움이 아닌 또 다른 감정적인 반응을 염두에 둔 것이다. “숭고한 현상은 매우 큰 것이어서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 엄밀히 말해 무한하지 않고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지만, 그것은 무한을 향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적으로 큰 것은 감관을 좌초시키면서 우리가 초감상적인 이성 능력을 통해 감관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알게끔 한다…. 숭고한 현상은 우리 자신 내에 숭고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3)
하지만 유한한 것으로부터 미를 느끼거나 감각의 영역을 넘어서는 무한한 것으로부터 숭고(혹은 필자는 경외와 두려움을 모두 포함하는)를 느끼든지 간에 예술적 창작물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현대미술이나 미학에서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환기해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명원의 작업에서와 같이 초월적인 테마를 다룰 때 더 중요하다. 이미지나 형상을 통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지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험이 보는 이로 하여금 인지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예술이 부차적으로 될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족적인 예술이나 소통을 위한 예술 다 이루기 어려운 과제이며 실은 상호보완적이기도 하다.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양립하기는 어렵지만, 예술이 영원히 미완의 과제라는 사실을 두 축이 지속해서 일깨워 준다.
최명원이 하늘을 그리면서 힘든 까닭도 여기에 있다. 화가는 하늘을 그림으로써 초월적인 세계를 다루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동시에 최명원은 초월적인 의미를 하늘, 바다 등의 거대한 자연 풍경적인 소재나 요소에서 찾고 있다. 절대자나 초월적인 개념을 특정한 형상으로 구현하는 일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는 결코 추상적이고 현학적인 소재를 선택하지는 않거니와 그러한 언어로 자신의 작업을 표현하지도 않는다. 영겁의 시간이나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물리적인 시, 공간, 질량을 넘어선 세계를 상정하지도 않는다. 젊은 세대의 화가가 사용하는 가장 일상적인 개인적인 언어로 초월적인 세계에 다가가고자 한다.
그렇다면, 국내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정신성이나 영성에 관심이 높아진 우리 시대, 심지어 대중문화에서도 ‘기운’을 말하는 시대, 예술이 어떻게 ‘하늘’이라는 물리적인 소재를 통해서 초월적인 세계를 다룰 수 있는가?
인간계와 초월적인 세계 사이에서
<하늘의 꿈> (2024)과 <밀려오는 찬란> (2024)은 최근 최명원 회화의 제목이다. 필자가 보기에 두 개의 그림 제목은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하늘이나 형상학적인 주제를 다루려는 화가의 의도와 직접 표현하지 않으면서 초월적인 세계를 암시하려는 상반된 예술가의 의도를 보여준다. 이처럼 서로 다른 예술가의 태도와 의도는 최명원 작업 제목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짙은 구름 사이’로부터 ‘눈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와 같이 지명이나 인간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단어가 제목에서 사용된다.
동시에 ‘찬란한 계절,’ ‘머물던’ 혹은 ‘가득 밀려오는 찬란,’ ‘눈부시도록 찬란한’ 등의 매우 감정적이고 내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형용사들도 등장한다. <가득>(2022)에서는 구름이 화면을 그득 메운다. 실제로 기독교에서 모세가 이집트를 나온 후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실제 현존하는 형태로 마주할 수 없다. 대신 자연의 현상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에게 전달된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형상이 아닌 목소리 혹은 안개나 불과 같은 존재성을 보여주는 우회적 재료를 통해서 나타난다. 인간은 절대자의 형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는 없다.
<하늘의 꿈>이나 <머물던>(2022)에 하늘 밑에 작은 교회와 동네가 위치해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에 교회의 첨탑을 위치시키는 것은 19세기 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예술에 대한 사랑으로 치환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빈센트 반 고흐(1853-1890)의 <별이 빛나는 밤에(The Starry Night)>(1889)을 떠올리게 한다. 최명원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에 교회 첨탑 이미지를 넣었다. 최명원의 <하늘의 꿈>과 <머물던>에서 비교적 즉흥성이나 표현적인 붓질이 강조된 하늘에 비해 회면 하단을 채운 동네와 언덕의 집, 동네와 교회는 세밀화 수법으로 그려내고 있다. 하늘의 경우 공기원근법이 사용되어서 뒤로 옅게 처리되고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인상을 주는 데 반하여 하단의 집들은 매우 세밀하고 선명하게 그려져 있으며 구획이 명확히 지어있다. 따라서 화가는 물리적인 주위 환경이나 일상적인 현재를 하단에, 그리고 초월적이고 거대하며 정확히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상단의 대기의 소용돌이를 한 화면에 병치시키고 있다.
<머물던>에서 근경에서 잡힌 풍경은 일상적이고 물리적인 오늘 현재성을 강조한다. 19세기 풍경화나 인상파를 연상시키는 듯 최명원은 자신의 회화가 그려진, 그리고 자신이 자연을 관찰한 시점을 제목에 반영하였다. 같은 장면을 반복적으로 그리는 방식은 이들이 자주 애용하던 것으로 방식이며 결국 예술의 중요한 목적을 관찰자의 시점, 각도에 새롭게 부여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때 인상파들의 경우 관찰자의 심성뿐 아니라 물리적인 시점의 변화와 외부 현상세계의 변화무쌍함에 집중하였다. 최명원도 구름, 대기의 현상, 물 위에 비친 빛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물리적인 변화를 세밀하게 잡아내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에 멀어질수록 색채를 흐리게 하는 공기 원근법은 관찰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관찰자나 관객의 심성과 더 연관되어 보인다. <밀려오는 찬란>이나 <기억 속의 빛>에서 수평선은 거의 사라진다. 오히려 화면 자체, 강하게 덮고 있는 선들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 한편으로는 바닷가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꽤 사실적인 풍경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바다 중간에 찍혀 있는 점은 별밤 시리즈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빛이 지나치게 충만해서 화면 중앙을 그득 채우고 그 덕분에 수평선이 보이지 않게 된다. 화가가 더 이상 자연을 세밀하게 재현만 하지는 않는다.
물리적인 자연계와 자연계를 바라보는 한정적이지만 초월을 갈망하는 심성의 세계는 결국 종교와 종교화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하늘 아래 땅의 눈에 보이고 경험이 가능한 일상적인 세계, 혹은 인간계를 초월적인 공간으로 대변되는 하늘의 세계, 혹은 관찰 불가의 기이한 세계와 대비시키는 것은 결국 종교의 기능과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종교는 초월할 수 없는 이들이 초월에 대한 신념을 지속해서 불러일으켜 주는 행위와 마음을 스스로 훈련하도록 이끈다.
수묵화의 현대적 변조가 의미하는 바
“이렇듯 나는 옅은 담묵으로부터 농묵까지 순차적으로 먹을 한지에 스미고 말리는 과정을 무수히 반복해 최종적으로 구름의 형상과 빛의 모양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나는 어둠을 그려 빛을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는 멀리서 보면 흑백의 하늘 풍경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한지의 결을 따라 번지다 정착된 먹의 자국들이 구름의 윤곽선을 만들어낸다.” 최명원, 20244)
최명원은 채색화의 장르가 아닌 수묵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서양화의 리얼리즘을 결합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과 새로운 현대 예술적 기법의 만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물리적인 리얼리티를 재현하고 그로부터 초월자의 질서를 찾아내려는 태도와 메시지를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 자연주의적인 리얼리즘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젊은 동양화 전공자들은 주로 수묵보다는 채색을 선호한다. 최명원도 예외는 아니지만 이번에 소개된 작업을 비롯하여 최명원은 꽤 독자적으로 수묵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기법에서도 장지 위 먹 이외에 약간의 다른 매체를 섞어서 부드러운 표면 효과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세밀화를 통해서 장르를 변화시킨다기보다는 전통적인 먹과 흑백의 사용 색상을 고수하되 기법에서만 필요에 따라 극사실주의를 사용한다. 전통 수묵화에서 강조하는 선을 최대한 억제하기 때문에 그러데이션 효과를 통해 양감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수법은 구름이나 물과 같이 비물질적인 자연 현상을 정확하고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다.
원래 리얼리즘은 물리적인 세계를 관찰하는 관찰자의 시 공간성을 강조한다. 이에 반하여 수묵화에서 비사실적인 흑백이나 먹은 외부 대상 세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에 존재하는 화가의 총체적인 존재성을 반영한다. 화가의 마음과 신체의 상태가 반영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 따라 붓질이 영향을 받는다. 흑백의 색상 자체가 이미 인위적으로 해석되고 굴절된 이차적 리얼리티라고 할 수 있다. 사실주의적인 작업을 하더라고 예술가의 해석이 수반되지만, 초월자가 만든 물리적인 리얼리티와 그 리얼리티 안에 숨겨진 영성을 발견하려는 화가에게는 물리적인 리얼리티와 이에 대치되는 만들어지고 해석된 회화의 특성 사이의 균형을 찾고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빛과 어둠의 결투로부터 배우다
서론에서 제기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어떻게 회화에서 재현할 것인가? 아울러 수묵과 리얼리즘이라는 각각 동양과 서양의 오래된 방식을 동시에 사용할 때 이들 간의 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흥미로운 점은 최명원의 수묵화는 한편으로는 일상적이고 사실주의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지어 추상적이고 초월적이다. 구름의 형태가 화면 전체를 채우게 되면 그것은 형태, 즉 이미지와 상을 부정하는 단계에 이른다. 덧붙여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명원은 켜켜이 묵이 스며든 한지를 쌓아 올린다. 이러한 과정은 그리는 일에 비해서 훨씬 화가가 시간과 공정으로 거쳐서 의식적으로 리얼리티를 변형시키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하늘 풍경이 아닌 한지 그 자체의 효과와 나아가서 추상적인 빛과 어둠의 대비 효과에 더 집중하게 된다.
이때 초월자의 뜻과 마음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찾아내고 재현하는 단계에서 점차로 그것을 재구성하고 해석해가는 화가의 역할이 도드라진다. 종교적인 메시지 그 자체보다는 빛과 어둠, 초월적인 세상과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한계가 서로 만나고 격돌한다. 이때 발견되는 화가의 태도가 우리 시대 종교적인 주제를 다루는 현대미술가의 나아가야 할 바를 보여준다. 빛과 어둠의 대비를 수묵이든, 사실주의이든 간에 관객이 화면 앞에서 단순한 형태나 색채의 효과가 아닌 전체 최명원의 시리즈에 나타난 대결 구도로 인식하게 될 때 새로운 배움, 혹은 깨달음의 실마리가 제공된다.
관객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거나 빛에서 어둠을 발견하게 될 때, 혹은 하늘 아래 일상성을 발견하고 다시금 하늘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을 초월적인 세상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다. 칸트가 말한 숭고한 시각적 경험이 우리를 숭고하게는 못 만들어줘도 자신 내에 숭고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듯이 말이다.
고동연은 지난 20여년간 한국에서 아트 레지던시의 멘토, 운영위원, 그리고 비평가로 활동해오고 왔다. 그녀의 최근 저서로는 『소프트파워에서 굿즈까지: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 현대미술과 예술대중화 전략들』(2018)과 『The Korean War and Post-memory Generation: The Arts and Films in South Korea(한국 전쟁과 후-기억 세대: 한국 동시대 미술과 영화)』(런던, 러틀리지, 2021)가 있다. 현재 이정실 교수와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Art in Context (1950-Now)』(런던, 블룸즈베리 아카데믹, 2024)를 공동 집필 중이며, 이화여대 겸임교수로 출강 중이다.
각주
1) 최명원, 작가의 글, 2024년 3월 12일 인용
2) 피오나 휴즈, 임성훈 역, 『칸트의 미적 판단력 입문』 (서광사, 2020), pp. 118-133.
3) 앞의 책, p. 126.
4) 최명원, 앞의 글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