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작품 및 오디오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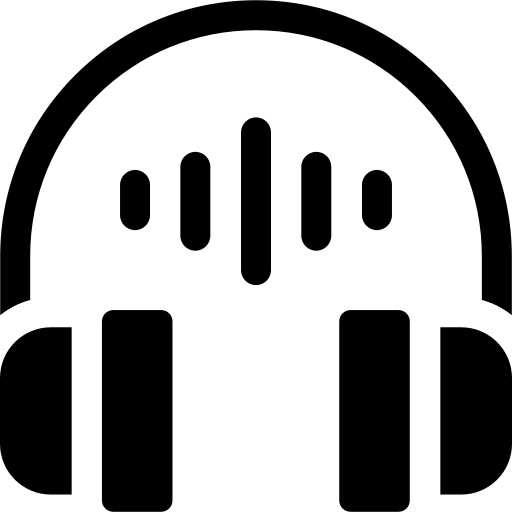

Mixed media on hanji, 145.5×112.1cm, 2023

Mixed media on hanji, 100×100cm, 2022

Mixed media on hanji, 145.5×112.1cm, 2023
* 오디오 가이드는 널위한문화예술 & 사적인컬렉션과 함께합니다.
BIOGRAPHY
2019
MFA.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2015
BFA. 성신여자대학교, 동양화과
SOLO SHOW
2023
<일렁이는 품> 도올 갤러리, 서울
2022
<말랑한 풍경> 서울정부청사 갤러리, 서울
GROUP SHOW
2024
<시각의 바다> 플레이스 막3, 서울
2023
<아득히 기록된 메모에 언젠가> 시안 미술관, 경북
<평평한 대화> 예술공간 서로, 서울
ARTIST STATEMENT
처음 일상의 낯선 순간을 작업한 것은 대학 시절이다. 침대 위에 축 늘어진 이불의 모양새, 염을 할때 할머니의 머리에 씌워진 두건, 선풍기에 쌓여진 천이 오버랩 된 경험으로부터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외부 세계와 마주하며 만들어지는 내면의 작용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끼고 작업을 이어오게 되었다. 일상의 모호하고 주목 받지 않는 풍경을 통해 내면의 작용을 탐구하며, 시각적으로 낯선 풍경을 만들고자 한다.
…
READ MORE
작업은 나와 외부 세계의 대상과의 관계 맺음이다. 일상의 풍경을 관찰하는 것은 작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풍경에도 마음이 있다. 풍경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시간과 애정이 필요하다. 메말라 죽어가는 식물이 무성한 나무가 되기까지, 예고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뽑혀 사라지는 과정을 바라보기도 한다. 소소하다면 소소한 변화가 나에게는 큰 사건처럼 다가온다. 나와 풍경이 관계를 맺는 태도는 인간과 내가 관계를 맺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늘 그 자리에 있는 당연한 풍경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언제 지루한 풍경 이였냐는 듯 낯설게 느껴진다. 비가 오는 날엔 빗물을 스치며 차가 지나가는 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며 길가에 무언가를 은폐하거나 보호하듯 감싸고 있는 방수천은 장례식을 떠올리는 풍경을, 보수를 위해 테이핑 해둔 비닐과 조명은 해와 파도가 치는 풍경으로 연결되는 지점을 만든다. 낯선 순간을 경험을 할 때면 일탈감을 느끼며 경직되어있는 일상의 시,공간을 말랑하게 만든다.
내면을 자극하며 그려지는 외부의 세계와 대상은 놓여진 각자만의 조건에서 삶을 살아내는 나 또는 주변인들의 모습과 닮아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신체가 있고 신체가 있는 것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말처럼 작업을 통해 나와 물리적 공간, 대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작업에는 감각,기억,상상,감정 등 내면의 작용이 담긴다.
ENG
First time I worked on unfamiliar moments in everyday life when I was in university. I started my work from the overlapping experiences of the shape of the blanket drooping on the bed, the headscarf worn on my grandmother’s head when she was shrouding, and the fabric piled up on the fan. I have been working on that I felt curious about the inner workings that are created while facing the outside world. I explore the inner workings of the mind through the ambiguous and unremarkable landscapes of everyday life, and try to create visually unfamiliar landscapes.
My work is a relationship between myself and objects in the outside world. Observing everyday landscapes is a large part of my work. There is also a mind in the landscape. It takes time and love to see the inner workings of a landscape. I sometime observe how a dried up and dying plant grows into a lush tree, or how disappeared by someone without any warning. Small changes seem like big events to me. The way I relate to the landscape is not unlike the way I relate to humans. When I look at the landscape with interest, even the most ordinary things that are always there seem strange, as if they were boring. On a rainy day, the sound of a car passing through rainwater sounds like the sound of waves, a tarp wrapped around something on the side of the road to cover or protect it reminds me of a funeral, and the plastic and lights taped up for repairs create a connection point to the sun and waves landscape. Whenever I experience an unfamiliar moment, I feel a sense of deviation that soften the rigid daily time and space.
The outside world and objects that are drawn while stimulating the inner side resemble me or the people around me who live their lives in their own conditions. As it is said that everything with life has a body, and everything with body is connected, I feel connected to myself, physical space, and objects through my work. My works include inner workings such as sensation, memory, imagination, and emotion.
CRITIQUE
사물의 살로 가득한 풍경 – 익숙한 것들의 낯선 귀환
– 김성호 (Sung-Ho Kim, 미술평론가) –
I. 프롤로그
작가 최혜연은 현대 한국화의 장에서 일상에서 마주하는 ‘익숙한 것들의 낯선 모습’에 주목한다. 그것들은 대개 남들이 특별하게 주목하지 않는 흔하디흔한 것이지만,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낯설게 다가온다. 예를 들어 작가가 언급하고 있듯이, ‘침대 위에 늘어진 모양으로 놓인 이불, 작가의 할머니 장례식에서 보았던 주검 위에 덧씌운 두건, 선풍기 위에 기이한 형상으로 겹쳐 쌓아 올린 천 조각’ 등이 낯선 장면으로 다가온다. 최혜연의 작업에서 이러한 ‘익숙한 것들의 낯선 모습’은 닫힌 공간을 넘어선 열린 공간, 즉 일상의 도시 공간 속에서도 발견된다. 도시의 공사 현장에 설치된 포장막뿐만 아니라 아파트 벽면을 배경으로 마주한 가로수의 모습이나 햇볕을 받아 건물 외벽에 길게 드리워진 가로수의 그림자, 그리고 두 건물 사이의 틈을 비집고 자라는 정원수 등 그녀는 익숙한 풍경 속에서 기이하거나 낯선 풍경을 발견한다. ‘익숙한 것들의 낯선 귀환’인 셈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녀는 작품 속에 어떠한 지향점과 미학적 메시지를 담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미술 현장에서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
READ MORE
II. 은폐된 것들에 관한 상상 – 심층의 마인드 스케이프
최혜연의 작품에서, ‘익숙한 것들의 낯선 귀환’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그것은 실상 ‘익숙한 것을 익숙하게 보지 않으려는’ 작가의 심리적 기제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대면하는 내면적 풍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대상의 은폐나 위장은 이러한 내면적 풍경을 이끄는 동인(動因)이 된다. 그 동인의 주체는 인공의 것이거나 자연 사물이기도 하다. 즉 그녀가 바라보는 풍경 속 사물을 덮어놓은 거대한 천이거나 건물을 가린 빼곡한 나무숲, 대지를 뒤덮은 엉클어진 수풀처럼 인공의 사물이나 자연 사물이 이러한 은폐나 위장의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공사장 현장을 뒤덮은 천막은 위장의 효과를 현저하게 드러낸다. 도로 반대편을 뒤덮은 거대한 천막은 통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사장 날것의 모습을 가릴 목적으로 풍경 속에 덧씌워진 것으로, 우리에게 익숙함 속의 낯선 풍경을 선사한다. 갑작스레 변화한 모습도 그러하거니와, 천막의 표면 위로 알 수 없는 모호한 형상을 우리에게 전하기 때문이다. 파헤쳐진 흙이나 건축 자재 더미를 덮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 천막은 표면 위의 굴곡과 주름을 만들면서 보는 이마다 다른 형상으로 다가서도록 만든다. 은폐란 늘 그렇다. 실체를 가리고 허구의 시뮬라크르를 대면하게 함으로써, 어떤 이에게는 동물의 형상으로, 어떤 이에게는 거대한 주검을 덮은 형상으로, 또 다른 어떤 이에게는 알 수 없는 기이한 무엇의 형상으로 보이도록 우리의 상상을 자극한다.
생각해 보라. 탱크나 비행기를 숨긴 군대의 위장막은 위장막 자체를 주변의 환경과 같은 유사한 배경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실체를 가리는 눈속임의 전략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눈이 가득한 산 위에서 전투를 준비하는 스키 부대의 하얀 위장복은 또 어떠한가? 인간이나 사물을 숨기는 이러한 위장과 은폐의 전략은 실체를 배경으로 전치하는 전유(appropriation)의 전략을 실행한다. 즉 누군가의 소유였던 원전을 빌려와 자기 것으로 만들되, 그것을 해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원전의 위상을 배반하고 전복하는 전유의 전략이란 ‘진실을 은폐하는 구조화된 언어’뿐 아니라 ‘사물 원전을 은폐하는 일상의 풍경’ 속에서도 실천된다.
다만 여기서 주요한 것은, 일상의 풍경에서 은폐와 위장이라는 전유의 전략을 읽어내는 작가 최혜연의 심리적 기제에 관한 것이다. 즉 일상의 사물 주체가 특별히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가 최혜연이 그것을 은폐와 위장으로 해설하고 그 위장된 일련의 막 뒤에서 숨겨진 실체를 밝히려고 하는 일련의 시도를 벌이고 있는 작가적 상상에 관한 것 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혜연의 작업은 사물과 자연 풍경 속에서 그녀만의 은폐라는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것을 내면의 조형 언어로 해설하려는 일련의 시도로 읽힌다. 즉 ‘익숙한 것을 익숙하게 보지 않으려는’ 작가의 상상과 심리적 기제가 만든 ‘심심(深深)한 마인드스케이프(mind-scape)’, 즉 ‘심층의 심상(心像) 풍경’이라 할 만하다.
III. 가시적 은폐가 견인하는 사물 흔적
최혜연의 작품에 드러난 ‘익숙한 것들의 낯선 모습’은 위장보다 은폐를 지향한다. 위장은 사물을 숨기고 배경과 같아짐으로써 사물의 부재를 마술적 효과로 획책하려는 고의적 속임수를 지향하지만 은폐는 작위(作爲)뿐만 아니라 부작위(不作爲)를 함께 동반하는 까닭이다. 즉 ‘마땅히 은폐할 일을 일부러 완전히 실행하지 않는 부작위를 동반함으로써, 그녀의 작품은 ‘가시적 은폐(visible concealment)’를 지향한다. 즉 사물의 일부는 가리고 숨기지만 일부는 드러내는 일, 또는 사물을 완전히 가리지 않음으로써 사물의 본질을 역으로 드러내는 일이 그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녀의 작품은 ‘감추기’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드러내기’를 최소한 실행함으로써 ‘드러내기’의 본질적 의미를 오히려 극대화한다.
작품을 보자. 바닥에 하얀 글씨와 표식이 새겨진 자동차 도로 건너편에 거대한 천막이 덧씌워진 풍경을 그린 작품 〈낮 그림자1〉은 구체적으로 그 은폐된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관객은 화면에 드러난 도로 등 일부 풍경을 통해서 천막 아래 도로 공사에 필요한 건축 자재 혹은 도로 공사 후 남겨진 잔재물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보거나, 작품 제명과 더불어 천막 위에 드리워진 사람 그림자를 통해서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도로 앞에 작가 혹은 누군가 있는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다. 자연스럽게 관객은 도시 공간에 은폐된 천막이 잠시나마 있다가 사라질 임시 사물 존재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천막이 품고 있는 굴곡진 형상을 통해서 관객은 저마다의 닮은꼴 형상을 상상해 볼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작품 〈낮 그림자2〉는 콘크리트 구조로 보이는 건물 외벽에 여러 그루의 나무 그림자를 드리운 풍경을 담고 있다. 관객은 벽면 전체에 드리운 무수한 그림자를 보면서 건물 맞은편에 울창한 가로수나 정원수가 서 있음을 유추하게 된다. 화면에서 실제의 나무는 모두 감추어져 있지만 그것의 시뮬라크르인 그림자를 대신 드러냄으로써 ‘드러내기’의 의미를 역으로 실행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최혜연의 회화는 ‘가시적 은폐’를 통해 ‘사물 흔적(traces of things)’을 드러냄으로써 은폐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구사한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물을 가린 천막이나 그림자를 드리운 건물의 벽면은 감추기와 드러내기가 한꺼번에 펼쳐지는 ‘가시적 은폐’의 장(場)이 된다. 즉 사물을 가리면서도 그 아래 사물 흔적을 드러내거나 반대로 사물을 감추면서도 그 위에 사물 흔적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천막이나 벽 자체가 실재와 허구가 교차하는 인터페이스(interface)가 되는 셈이다.
최혜연의 작업에서 ‘가시적 은폐’의 장은 도처에 있다. 작품 〈기찻길 A〉에서는 작품 좌측에 가득하게 들어선 나무숲이 전체 화면을 마치 장막처럼 가리면서도 우측 상단에 기찻길 풍경을 원경으로 살짝 드러낸다. 또한 작품 〈초록의 덩어리〉에서도 좌측으로부터 시작된 수풀 덩어리가 화면의 전체를 거의 가리면서도 우측에 살짝 원경의 풍경을 드러낸다. 숲 자체가 장막의 기능을 하면서 ‘가시적 은폐’의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하겠다. 교차로 혹은 회전로를 포착한 장면일까? 화면 중앙을 가득 채운 나무숲도 장막의 역할을 하면서 그 주변에 원경의 풍경을 살짝 드러내면서 ‘가시적 은폐’의 주도적 역할을 선보인다.
이처럼 최혜연의 작품은 도시 풍경에서 펼쳐지는 ‘가시적 은폐’를 통해 자연 사물과 인공 사물의 미묘한 만남을 주선하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사물의 흔적을 강력하게 드러낸다. 때로는 자연 사물이 장막처럼 펼쳐지고 때로는 인공 사물이 그것처럼 펼쳐지면서 말이다.
IV. 지표로서의 사물 흔적과 초현실주의적 상상
은폐된 것들에 관한 상상을 부추기는 ‘심층의 마인드 스케이프’라 부를 만한 최혜연의 회화는 일부는 드러나고 일부는 은폐된 사물을 통해서 ‘가시적 은폐’의 개념을 공고히 한다. 이때 작품 속에 강조되는 사물 흔적은 대개 화면을 커다란 크기로 점유하는 비대칭적 구도 속에 자리한다. 무언가를 뒤덮고 있는 커다란 은폐의 막, 그림자로 뒤덮인 회색의 벽면 혹은 혹은 이파리가 점묘법처럼 묘사된 울창한 나무숲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인공 사물이든 자연 사물이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그리고 주체와 대상의 관계 맺음 속에서 사물 흔적을 강력하게 화면 속에 소환한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사물 흔적은 존재의 문제의식을 인덱스(index)의 개념으로 시각화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인덱스는 표상하는 사물과 의미 사이의 인과 관계와 상관성을 드러내는 기호이다. 기호학에서 인덱스는 ‘지표(指標)’로 번역되는데, “방향이나 목적, 기준 따위를 나타내는 표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작품 〈낮 그림자1〉에서 도로 한 편에 뒤덮인 거대한 천막은 천막 안에 흙이나 공사 기자재 등 공사 현장과 관계된 사물들이 들어 있다는 지표가 된다. 작품 〈낮 그림자2〉에서 건축물 벽면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 것은 태양이 고도를 낮추면서 등장하는 이른 오전이나 사라지는 늦은 오후라는 지표가 된다.
‘흔적’이라는 것이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를 의미하듯이 ‘지표’ 또한 사물과 사건의 인과 관계를 추적하게 만든다. 그것은 대개 과거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가올 미래를 알리는 징후가 되기도 한다. 작품 〈밤의 빛 2〉을 보자. 이 작품에서는 가로수가 빽빽하게 서 있는 어느 밤길의 두 사람이 얼굴을 보이고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은 작가가 풍경을 보는 시점의 방향으로 있는 순간을 알리는 지표가 된다. 작품 〈밤의 빛1〉에서 관객은 가로등 불빛을 받은 채, 수풀을 마주한 도로 인근에 거대한 꾸러미를 덮고 있는 천막이 가로등이 꺼지는 아침이 되거나 어떤 특정한 날이 되면 이내 벗겨져 어떤 사건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에 이른다. 가로등이나 꾸러미를 덮은 천막 자체가 특정한 미래나 불특정한 미래 사건에 대한 지표가 되는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최혜연의 작품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삶의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과거의 흔적이나 미래에 대한 예고가 지표를 남기는 것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초현주의적 상상을 드러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내 공간에 어떤 보수 공사가 있었음을 반영하는 과거 ‘지표’로서의 거대한 비닐이 밝은 조명 아래 덮여 있는 풍경을 담은 작품 〈해와 파도〉에서 작가는 ‘해가 빛나는 가운데 일렁이는 파도’를 상상한다. 또한 그녀는 앞서 살펴본 도시 공간에서 발견한 무엇인가 덮어놓은 방수천에서 장례식을 상상하기도 한다. 가히 지표로부터 떠올리는 초현실주의적 상상이라고 할 만하다. 마치 비가 퍼붓는 날에 파도 소리를 연상하면서 바다 풍경을 상상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초현실주의 상상은 익숙한 일상 공간을 낯설게 만드는 그녀의 작품 도처에서 발견된다. 작가의 표현대로 이러한 ‘낯설게 하기’는 경직된 일상의 시공간을 말랑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현한다.
V. 사물의 살로 가득한 전면 회화 – 만남의 관계 지형과 물질적 상상력
최혜연의 작업이 드러내는 ‘익숙한 것들의 낯선 귀환’은 화면의 많은 부분을 장막처럼 가리운 화면 배치는 물론이고 그것이 확장한 전면 회화의 방식에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대상의 재현을 원거리에서 포착하는 방식에서부터 근거리로 전환해서 클로즈업의 효과를 도모하면서 극대화된다. 일상에서 만나는 흔하디흔한 수풀 혹은 잡초의 군집을 화폭 안에 가득 채우면서 실현되는 이러한 전면 회화는 거리감을 탈각시키고 대상을 마치 패턴화된 자연 문양처럼 인식하도록 만든다. 검은 먹과 하얀 호분이 뒤섞인 ‘수풀로 우거진 식물 개체들의 면면’이 나름대로 분별이 가능하면서도, 마치 하나의 식물 덩어리처럼 표현된 까닭이다.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만드는 이러한 그녀의 전면 회화는 전체상과 부분상 사이의 거리를 탈각시키고 이미지 전체를 바슐라르(Gaston Bachelard)가 언급하는 ‘질료적 이미지 혹은 물질적 이미지(image matérielle)’로 치환한다. 바슐라르에 따르면, 우리가 관성적으로 간주하는 이미지란 문화 콤플렉스(les complex de culture)라고 하는 문화적 관습과 방향성에 따라 이미지의 대상을 형태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형태적 이미지(image formelle)에 해당한다. 이것은 매우 즉각적이고 즉흥적인 면모를 띤다. 이와 다르게, 따뜻함과 차가움, 건조함과 축축함과 같은 사물 본성으로부터 오는 물질적 이미지는 우리를 이미지의 심층, 즉 ’변화 가능한 무한한 무정형의 어떤 세계‘로 견인한다.
최혜연은 농묵을 한지 위에 갈필로 지나치게 만들어 건조한 풍경을 만들거나, 담묵이 한지를 적신 축축한 질료감의 바탕 위에 농묵과 더불어 텁텁한 질료감의 호분을 반복적으로 교차시키는 회화 행위를 통해서 물질적 이미지를 구축한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회색톤의 중성화(中性化, neutralization)를 이룬 화면을 구축한다. 회색톤이 전면에 자리한 그녀의 중성적 화면은 재현 대상과 바탕을 한 덩어리로 인식하게 하는 한편, 흑으로 가는 과정과 백으로 가는 과정을 암시함으로써 이미지의 운동성을 잉태한다. 게다가 여기에 덧붙여 먹이나 호분으로 자연 사물을 표현한 몰골법(沒骨法)의 방식은 화폭에 무수한 획(劃)의 운행 과정을 고스란히 남김으로써 정태성을 벗어난 물질의 역동성을 강화한다.
바슐라르에게서 형태적 이미지는 시각적이고도 정태적인 이미지에 속하지만, 물질적 이미지는 정신적이고도 역동적인 이미지로 간주한다. 물질이 함유한 사물 본성에서 기인하는 정신적 이미지는 보이는 것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불러오는 까닭이다. 작가 최혜연이 먹과 호분이 병치, 혼성된 물질적 이미지가 가득한 ’도시 속 자연 사물 풍경‘에서, 피상적인 물질의 피부를 걷어내고 물질 내면의 깊이에서 맞이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필자는 그것을 바슐라르가 언급하는 물질적 상상력(l’imagination matérielle)으로 풀이하고자 한다. 바슐라르에 따르면 물질적 상상력은 “현실을 넘어서 현실을 노래하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능력”이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유형을 지니는 비전에 눈을 뜨게 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경탄하는 능력”이다.
최혜연의 ’도시 속 자연 사물 풍경‘은 사물의 표면이 아닌 사물의 내면과 그 깊이에 응시하면서 바슐라르 식의 물질적 상상력을 실천한다. 그것은 질료가 지닌 촉각적 물질감을 고스란히 드러냄과 동시에 그것에 부여된 주관적 감성과 사유를 올려놓는 것이다. 눈에 지각되는 풀잎 하나하나의 세밀한 구조가 아니라 풀잎들이 얽힌 그래서 덩어리처럼 존재하는 물질적 이미지의 깊이를 탐구하는 것이자 그 위에, 보이지 않는 것의 이면에서 끌어올리는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인 감성적 사유를 얹는 것이다.
최혜연의 작품에서 물질적 상상력으로 대면하는 자연 사물은 더 이상 지각의 대상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마치 대화의 대상자인 또 다른 주체의 위상으로서 꿈틀거린다. 따라서 우리는 그녀의 작품에서 퐁티(M. Merleau-Ponty)가 주목했던 주체와 대상의 관계 인식, 달리 말해 주체의 역전 혹은 상호 작용적 주체에 관한 철학적 의미를 읽어낸다. 세계를 대면하는 인간 주체의 살(chair)은 이제 인간에게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퐁티의 철학이 전하는 것처럼, ‘사물의 살’로 전이되고 이것이 ‘세계의 살(chair du monde)’로 세상을 가득 채운다.
글을 마치자. 최혜연이 도시 풍경 혹은 자연 사물을 대면하면서 현대 한국화로 천착하는 물질적 이미지는 더 이상 대상이 아닌 인간과 소통하는 상호적 주체로 거듭나고자 한다. 질퍽한 농묵과 호분의 역동적 이미지로 가득한 그녀의 작업은 오늘도 물질의 형상을 벗고 그 물질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물질적 상상력으로 길어 올리는 주관적 감성과 성찰의 사유로 꿈틀거리는 무엇이 되고자 한다.
(20240320)


